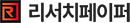지난해 미국에서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의 비율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이 16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의 빈곤율(4인가족 기준 연소득 2만456달러 이하 가계의 비중)이 12.7%로 2015년 13.5%에 비해 하락했다.
이처럼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줄어든 데에는 미국 가계의 중위소득이 5만9039달러로 한해 전 보다 3.2%(인플레이션 조정 시) 늘어난 영향이 컸다. 2015년 5.2% 늘어난 데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다.
노동시장도 개선되며 미국 가계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는데 일조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한 미국인의 수는 2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종합 시사지 '더 아틀란틱'(The Atlantic)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미국인의 수가 줄긴 했지만 2016년 기준으로 여전히 4천만6천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소득 하위 20%인의 평균 가계소득은 10년 전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20%가 지난해 총 가계소득의 51.5%를 벌었는데 이는 2015년 51.1%보다 확대된 비중이다.
지난해 미국 가계의 연소득이 늘었지만,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
지역별 격차도 확대됐다. 전반적인 빈곤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디트로이트에서 빈곤율은 오히려 올라갔다.
지역 매체인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빈곤율은 2016년 36%로 2009년의 33%에서 올라갔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급격히 쇠락하며 디트로이트에서 고용 여건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2015년의 40%에서는 소폭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