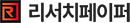미국 텍사스대학교 인구연구센터 소속 사회학자인 새라 번의 연구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으로 경찰의 감시 업무 범위가 증폭됐고 그 방식도 급변했다. 번은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함께 정치 및 사회 시스템과 규제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번은 빅데이터가 경찰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불평등 문제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 단지 특정 인종이라 해서 의심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빅데이터가 경찰 활동에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보아 불평등을 조장할 부정적 요소도 관찰됐다.
번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선구적이라고 알려진 LA 경찰국 소속 75명의 형사와 민간 직원을 관찰하고 인터뷰했다. 번은 형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경찰 내부 경로를 통해 입수했거나 민간으로부터 구매한 개인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해 범죄 리스크를 측정하고 치안 활동을 하는지 조사했다.

번에 따르면, 개인 정보 수집이 활성화된 것은 9/11 테러 이후부터다. 9/11 테러는 정보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는 비난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9/11 이후 미 연방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각 경찰국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했다.
번은 빅데이터 활용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이 용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해서도 막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드래그넷 감시 시스템을 사용해 경찰차에서 차량 번호판 리더기를 이ㅅ용해 차량을 촬영하거나 이동 패턴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과거에는 수집하는 데 영장이 필요했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경찰은 민간 데이터 브로커들로부터 정보를 구입하기도 한다. 이들 브로커는 개인이 관계를 맺었던 기업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구매해 다시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또한 경찰은 요주의 인물이 특정 경로를 이탈하거나 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각기 다른 감시 시스템으로 얻은 정보를 취합하면 경찰은 과거 영장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었던 개인의 삶에 대한 온갖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사생활 침해 문제
의료 부문에서도 빅데이터로 인해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앞으로 몇 년 내에 수백만 명의 DNA 데이터나 진료 기록이 수집돼 질병 진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위스 소재 소피아 제네틱스(Sophia Genetics)는 현재 12만5,000명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았으며 2020년까지 100만 명의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피아 제네틱스는 9개 영국 병원과 협업해 낭포성 섬유증, 선천적 심혈관 질환 및 암 등 유전적 질병의 유전자 패턴을 알아내기 위해 환자들의 DNA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가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과 민간 기업이 주고 받는 상품으로 전락시킨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HIV 감염 및 낙태 여부, 정신 질환 병력 등 환자 160만 명의 의료 기록을 구글의 인공지능 자회사인 딥마인드(DeepMind)에 불법적으로 넘긴 사실이 지난 7월에 밝혀졌다.
건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메드컨피덴셜(MedConfidential)의 필 부스는 "기밀 유지는 의사와 환자 간 관계뿐 아니라 전반적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