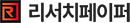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어떻게 해야 생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인간답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평온한 임종을 맞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선 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각종 의료장비에 의존하다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외롭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술의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병원이지만 최악의 죽음을 맞게 하는 곳 또한 병원이다. 과도한 생명 연장 치료로 중증 환자들이 끔찍하게 생을 마감하는 데는 의사와 환자 간 죽음에 대한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에서 '임종기 케어'(end-of-life care)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안젤로 볼란데스(Angelo Volandes) 박사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의료진과 터놓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볼란데스는 말기 환자가 자신의 의료적 처지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죽음과 향후 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가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병을 앓는 환자와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다. 게다가 의사가 구두로 설명하는 의료적 처치 방법에 대해 환자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환자와 의사 간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란데스는 설명했다. 또한 의사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를 한층 두렵게 만들거나, 환자들이 붙잡고 있는 희망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생명연장치료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볼란데스 교수는 비영리단체 '어드밴스 케어 플래닝 디시전스'(Advance Care Planning Decisions)를 설립하고, 말기 환자들에게 '생명연장치료'(life-prolonging care), '제한적 치료'(limited care), '완화의료'(comfort care)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환자, 가족, 의료진 등을 인터뷰하고 중환자실, 요양원, 수술실 실상 등을 촬영해 각각을 선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지 보여주는 동영상을 만들었다.
2015년에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들"(The Conversation: A Revolutionary Plan for End-of-Life Care)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표하고, "환자가 중병에 걸렸을 때 의사, 환자, 가족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지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는 물론 환자 가족들도 환자와 죽음에 대해 대화하는 일이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볼란데스 교수는 말기 환자가 선택 가능한 의료적 요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볼란데스가 환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빌자면, '생명연장치료'를 선택하는 환자는 "의사 선생님, 저는 딸 아이 결혼식에 꼭 참석하고 싶어요. 고통스러워도 참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오래,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제한적 치료'를 고르는 환자들은 "제게 도움이 될 모든 가능한 치료를 원해요. 하지만 고통스럽기만 하고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치료는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셈이다. '완화의료'를 원하는 환자는 "가능하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임종 직전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ICU)에 들어가고, 심 정지 후 심폐소생술(CPR)을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볼란데스 교수가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CPR이 무엇인지 중환자실의 삶이 무엇인지 본 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수명연장치료' 대신 '제한적 치료'나 '완화의료'를 택했다. 연명만을 위한 공격적인 처치 대신 통증 완화 등을 통해 마지막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처치를 받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이다.
문제는 모든 의료진이 볼란데스처럼 냉철하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의사들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에 환자나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환자들은 저마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죽음에 접근하는 방식과 태도가 다를 수도 있다.

한편 '뉴요커'(The New Yorker)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의 13세 흑인 소녀 자히 맥매스(Jahi McMath) 이야기를 다루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It Mean to Die?)라는 질문을 던졌다. 맥매스는 뇌사 판정을 받았지만 가족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맥매스가 곧 깨어날 것이라 굳게 믿었다. 맥매스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한 채 4년을 보냈고, 한 신경과 전문의는 맥매스가 "극도로 몸이 불편한 상태지만 매우 활기찬 10대 소녀"라고 주장하며, 맥매스에게 사망을 선고한 의사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뉴요커는 "맥매스 사례는 존재의 본질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던 맥매스는 오클랜드 아동병원(Oakland Children's Hospital)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 병원의 의료 과실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간호사인 맥매스의 할머니는 오클랜드 아동병원의 의사들이 기본 수칙을 어기고 맥매스를 홀대했다고 주장했다. 어느 날 밤 자정 무렵, 맥매스의 심장은 정지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로 맥매스의 심박동을 회복한 후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하지만 이틀 뒤 맥매스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동공이 확대되고 구역반사가 소실되고 뇌파활동도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맥매스의 가족은 분개했다. 사회복지사가 여러 차례 찾아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장기를 기증할 것을 권유했지만 가족들은 단호히 거절했다. 예심재판소 판사는 스탠포드대학 아동병원 (Stanford University's children's hospital)의 아동신경학자인 폴 피셔 박사에게 맥매스의 상태에 대한 의학상의 소견을 구하라고 판결했다. 피셔 박사는 표준 뇌사 검사를 수행한 후 맥매스가 뇌사 상태라고 결론 내렸다.
그 후 법원의 보호명령이 거의 만료되어 오클랜드 아동병원 의료진들이 맥매스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을 무렵 이 판사는 보호명령 기간을 8일 연장했다. 병원의 의료 과실과 태만 행위, 맥매스의 사망 선고 등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였다. 검시관은 맥매스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 대기 중'(Pending investigation)이라고 썼다.

가족의 상해담당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족들은 휴대용 인공호흡기를 매단 맥매스를 비행기에 태우고 뉴저지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뉴저지는 종교적 이유로 가족들이 병원의 뇌사 판정을 거부할 수 있는 미국 내 두 개 주 가운데 한 곳이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맥매스를 뉴저지에 있는 세인트피터대학병원(St. Peter's University Hospital)으로 데려갔다. 이들의 결정에 대해 미 언론들은 '사체'가 곧 부패할 것이라며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당시 맥매스는 3주 동안이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했으며 장기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세인트피터대학병원의 소아과 중환자실 실장은 "맥매스의 뇌는 회복 조짐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3개월 더 맥매스를 받아줬다. 그런데 갑자기 맥매스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얼굴에 부기가 가라앉으며 피부도 탄력을 되찾았다. 의사들이 이미 사망을 선고한 맥매스가 기존 치료 방법을 전혀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는 의학적 관점에서 죽음의 정의에 대해 본질적으로 도전하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김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