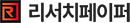전쟁은 인간은 물론 동물 세계도 위협한다. 전쟁이 인류사회에서는 분쟁 해결 수단 중 하나라면, 동물들은 이 때문에 멸종 위기에 치닫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형 동물들이 전쟁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 코뿔소와 코끼리 등 대형 동물에 초점을 둔 이번 연구는 아프리카에서 수년 째 벌어지고 있는 분쟁으로 인해 해당 동물의 개체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지난 70년 동안 아프리카 보호 야생 지역 70% 이상이 전쟁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일대학 조쉬 다스킨 생태학 교수는 전쟁과 동물 개체수 감소 간 상관관계 연구를 네이처지에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립공원 70% 이상이 전쟁의 영향을을 받은 아프리카 대륙 19개국에 분포된 126곳 보호구역에서 253종 대형 초식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다스킨 교수는 "지난 20년간 벌어진 모든 분쟁이 야생동물 평균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해마다 전쟁이 빈번하게 재발되는 지역 내 야생동물보호지역에 서식하는 대형 포유동물 35% 가량이 생명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 저자인 롭 프링글 교수는 "동물들은 전쟁지역에서 발포되는 각종 무기로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지역 내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인해 죽는 경우가 많다"며 "전쟁 지역은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다보니 거주민이 보호 동물을 먹거나, 상아·뿔 등을 팔기 위해 밀렵을 자행한다"고 밝혔다.

우간다 국립공원, 고롱고사 국립공원 사례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면 동물 보존 프로그램도 기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지난 1983~1995년 사이 우간다 국립공원 기린과 1977~1992년 모잠비크 고롱고사 국립공원의 여러 동물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고롱고사 국립공원에 서식하던 얼룩말과 버팔로는 식량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사냥감이 됐다. 또, 사람들은 수천 마리 코끼리를 사냥해 상아를 팔고 생필품과 무기를 구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고롱고사 국립공원 대형 포유동물의 약 90%가 굶주림이나 총에 맞아 죽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0가지 원인이 동물의 개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요인에는 ▲동물의 크기 ▲전쟁의 강도 ▲가뭄 ▲인구밀도 ▲보호 구역 등이 포함됐다. 다스킨 교수는 "고릉고사 동물의 죽음은 전쟁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프링글 교수는 "전쟁은 끔찍한 결과를 낳았지만 종말론이 거론될 만큼 극단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1992년 시민전쟁이 끝난 이후, 고롱고사 국립공원의 야생 동물은 서서히 늘어나 현재는 전쟁 전의 80% 정도로 회복됐다"고 전했다.

기아, 가뭄도 동물 개체수 감소 원인
연구에 따르면 기아, 가뭄도 야생 동물 개체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전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스킨 교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65년간 대형 포유동물 개체수를 분석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면 빈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보호 구역 안으로 들어가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시작한다"며 "이후 해당 지역에서 비영리단체를 몰아내고 밀렵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스킨·프링글 교수는 "인간의 전쟁이 야생동물의 개체 동향을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됐다"며 "야생동물 보호를 포함한 평화 유지 등 새로운 보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심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