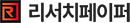자연이 삼림벌채의 잔존물을 치우는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간이 숲을 개간할 때마다 자연이 살아남은 나무를 제거해 다시 한번 풍경을 균일하게 만든다는 논리다.
미국 신시내티대학(UC) 지리학자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지구상의 대부분 풍경이 왜 균일성을 갖는지 보여준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삼림벌채는 삼림이 개간되는 활동 및 사건을 의미한다. 자연적으로는 산불로 숲의 나무가 탈 때 발생한다. 숲의 잔해는 새로운 종의 동물과 나무를 위한 길을 닦는 역할을 한다. 반면 인공적인 삼림벌채는 인간이 나무를 잘라 숲을 농경지 재배 등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이 크다.
UC 연구팀은 위성 이미지를 활용해 삼림벌채 지역에 남아있는 나무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 삼림벌채가 숲의 약 절반까지 진행되면 인간의 개입 없이도 나무가 갑자기 빨리 사라진 것이다.
연구의 수석 저자 토마즈 스테핀스키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자연은 균일해지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숲의 한 부분이 변하면, 다른 부분도 비슷하게 바뀐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를 위해 유럽우주국에서 입수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분석해 삼림벌채와 전 세계적 산림손실 패턴을 평가했다. 각각 9km 너비의 약 180만 개 이미지를 사용해 7개 대륙의 삼림벌채 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적용 범위는 1992~2015년까지였다.
이후엔 풍경 종류에 따라 분류, 총 64개의 사용 가능한 이미지로 풍경 조합을 형성했다. 그리고 변화를 관찰해 남아있는 숲의 개간을 재촉한 요인을 파악했다. 그 결과, 1992~2015년 동안 거의 15%가량에서 지배적인 조경 유형이 이동하는 사실이 관측됐다.
연구팀은 몬테카를로 기법을 사용해 약 수백 년에 걸친 시간 흐름에 따른 조경 변화 가능성을 예측했다. 그 결과 풍경이 균질적이고 동일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떤 대륙에서도 풍경이 혼재된 채 남아있지 않았다. 이는 사막이나 산, 습지 등 단일 유형의 풍경이 풍부하다는 것에서 이미 잘 나타난다. 두 가지 지배적인 풍경 유형이 혼재할 경우 자연은 가장 강한 유형을 선택한 뒤 지배적으로 바꿨다.
인간이 숲을 개간하고 용도를 바꾸면 자연은 자동으로 이 계획에 반응한다. 인간이 삼림벌채를 끝내면, 자연이 남은 나무를 치운다. 모든 나무가 제거됐든 아니면 일부만 제거됐든 상관없이, 자연은 일단 숲의 경치가 흐트러졌다고 판단되면 경치를 다시 가다듬는 역할을 한다.
즉, 인간이 남기고 간 여러 나무의 잔해나 남아있는 나무들을 풍경의 균질성 유지를 위해 다시 한번 제거하는 것이다. 몇 년이 지나면 전체 산림 영역은 새로운 풍경 유형으로 바뀌게 된다. 인간이 숲을 오랫동안 포기하면 자연이 알아서 해당 지역에 새로운 숲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해 위성 이미지 분석이 자연의 일부가 어떤 힘에 의해 방해받을 때마다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연이 균일성을 선호하며 다양성을 싫어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의 활동으로 소실된 지역을 되살릴 수 있다는 잠재성을 암시한다.

산림 모니터링 관련 웹 애플리케이션 글로벌포레스트워치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많은 주요 열대우림이 소실됐다. 전체 면적별로는 브라질이 134만 7,132헥타르(ha)로 1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손실 비율별로는 가나가 60%로 가장 높았다. 2018년에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주요 열대우림 손실의 46%를 차지했다.
또한 숲의 자연적인 화재가 주요 열대우림의 손실에 큰 부분을 차지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손실과 관련된 가장 큰 요인은 아마존의 삼림벌채였다.